
빵을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온도와 수분, 시간의 3박자를 골고루 갖춰야 한다.

담백한 빵을 숭덩숭덩 잘라 토마토, 올리브 등 다양한 채소와 곁들이면 훌륭한 한 끼 요리가 된다.

차갑게 즐기는 참치 샌드위치는 만든 후 식빵은 30분 뒤, 바게트는 2시간까지 실온에 두었다가 먹는 것이 좋다.

물과 소금, 효모, 밀가루 등 4가지만 있으면 빵을 만들 수 있다.

묵은 빵을 처리하기 좋은 방법으로 알려진 프렌치토스트는 진짜 묵은 빵으로 만들면 맛이 없다.
도정한 밀의 배젖(곡식의 몸통)을 가루 낸다. 물과 소금, 효모를 더해 치대면 탄성을 품은 반죽이 된다. 그대로 1차 발효를 시켜 맛을 불어 넣고, 반죽을 나눠 빵의 모양으로 빚어 2차 발효를 시킨 뒤 오븐에 굽는다. 세 문장으로 요약한 빵의 탄생 과정이다. 정말 이 4가지의 재료만 쓴 바게트 같은 빵은 소위 ‘담백’해지며 속살의 탄성도 강하고, 버터 등을 더하면 지방이 반죽의 글루텐을 잘게 끊어줘 한결 더 부드러워진다. 식빵이 대표적인 예이다.
빵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빵은 온갖 오해에 시달린다. 특히 같은 한 음절 단어이자 부사인 ‘갓’과 가장 많이 얽힌다. 갓 구운 빵이 가장 맛있다는 믿음 말이다. 물론 마음으로는 갓 나온 빵이 맛있다. 빵집을 취재하다가 정말 오븐에서 갓 나온 빵을 맛본 적도 있다. 몇 시간 동안 주방에 꼽사리 껴서 밀가루가 반죽이, 또 빵이 되는 과정을 지켜 보고 나면 경이로움 때문에라도 정서적인 맛은 정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하지만 입과 혀가 견딜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갓 구워낸 빵의 내부 온도는 90℃ 안팎이다. 물이 100℃에서 끓으니 불덩어리나 다름 없다. 게다가 식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용암과도 비슷한 상태인지라 조직이 취약해서 질감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물컹거려 칼로 잘 썰리지 않고 손으로 잡아 뜯으면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다. 이래저래 실용적이지 않으니 집에서 직접 빵을 구워 먹은 지가 10년이 넘으면서도 오븐에서 갓 꺼낸 빵은 손대지 않고 곱게 식힘망 위에 두는 이유가 있다.
일단 완전히 식힌 빵을 다시 구워 기를 불어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적당히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 빵 속의 수분이 살아나면서 바삭하고 부드러운 질감도, 고소하고 구수한 맛도 살아난다. 그럼 구워 먹기 전의 빵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 장소는 하루 이틀 내에 먹을 분량이라면 상온, 두고 먹을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냉동실이다. 결국 냉장실은 피하라는 말인가. 그렇다. 전분의 노화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온도대라 빵이 삭아버린다. (같은 원리에서 역시 탄수화물인 밥도 냉동 보관한다.) 식빵처럼 애초에 토스터에 최적화된 빵이라면 그대로, 만일 아니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리 손질해 냉동시키는 게 좋다.
손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썰어두기가 전부이다. 베이글이나 바게트, 치아바타 같은 빵은 온전한 상태에서는 토스터에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냉동실에서 갓 꺼내면 딱딱해 썰리지도 않아 바로 먹을 수가 없다. 특히 바게트나 치아바타는 빵의 길이와 수직 방향으로 썰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표면적이 줄어 들고 특히 샌드위치는 해 먹기 어려워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덩어리로 사다가 일단 수평으로 반을 가르고 토스터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수직으로 등분해 준다. 이렇게 썬 빵은 지퍼백에 그대로, 혹은 플라스틱 랩으로 싸서 보관한다. 길게는 6개월까지 두고 먹을 수 있다.
샌드위치도 수분 조절이 필수
갓 만든 게 생각보다 맛이 없기는 샌드위치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샌드위치는 간편식이다. 샌드위치는 식사 탓에 멈추지 않고도 카드 놀이를 즐기기 위한 18세기 백작의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갓 만들면, 즉 빵 사이에 재료를 켜켜이 쌓고 소스를 적당히 뿌려준 직후에는 재료가 한데 어우러지지 않아 썩 맛있지 않다. 구멍이 송송 나 조직이 스폰지 같은 식재료나 음식이 여럿 있는데 빵도 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빵이 특히 소스의 수분과 맛을 어느 정도 흡수해 전체가 어우러진 뒤에 먹는 게 훨씬 맛있다. 못 믿겠다면 서브웨이 같은 전문점의 샌드위치를 사다가 다만 십 분이라도 두었다가 먹어보자. 맛과 질감이 사뭇 다를 것이다.
직접 만들어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치 샌드위치를 예로 들어보자. 통조림을 먹고 싶은 만큼 준비해서 캔의 뚜껑을 조금만 따내 생긴 틈으로 물기를 짜낸다. 마지막에는 캔 자체를 꼭 눌러 물기를 남김 없이 짜낸 뒤 대접에 담아 소금과 후추, 식초 약간으로 간하고 마요네즈를 더해 잘 버무려 섞는다. 곤죽이 된 참치를 빵 한 쪽에 잘 펴 바르고 다른 한 쪽으로 덮은 뒤 플라스틱 랩으로 꼼꼼하게 싼다. 식빵처럼 부드러운 것이라면 30분, 바게트처럼 딱딱한 빵이라면 2시간까지 실온에 두었다가 먹는다. 바게트 같은 빵은 속살을 조금 파내는 것도 좋다. 한편 참치에는 양파, (쪽)파, 올리브, 셀러리 등 좋아하는 부재료를 송송 썰어 더해 맛과 질감의 표정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결국 맛을 지닌 수분이 스폰지 같은 빵의 조직에 조금 배어야 더 맛있어진다는 원리인데,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수분 관리를 잘못할 경우 빵이 곤죽이 되어 버려 샌드위치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같은 샌드위치라도 점심 거리를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만들어 놓았다면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이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빵을 수분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해 줘야 하는데,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이 나설 차례이다. 빵의 단골 ‘반찬’인 버터와 치즈를 다른 재료와 접촉하는 안쪽 면에 바르거나 올리면 방수뿐만 아니라 맛도 더해주는 일석이조의 켜를 씌울 수 있다.
조립에 가까운 차가운 샌드위치가 물린다면 더 요리 같은, 따뜻한 샌드위치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해보자. 이탈리아의 파니니나 미국의 그릴드 치즈가 대표적인데, 맛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빵 사이에 치즈처럼 잘 녹는 식재료를 끼운다. 둘째, 샌드위치 자체를 잘 달궈진 팬에 올려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주며 굽는다. 빵이 납작해지며 녹는 치즈의 맛을 흡수하는 한편 바삭함이 강조된다. 어떤 무거운 물건으로 빵을 눌러 줄 것인가. 인터넷을 뒤지면 무쇠로 만든 파니니 전용 누르개, 더 나아가 전용 전기팬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 누르개는 크지도 비싸지도 않지만 이름처럼 샌드위치를 누르는 것 외에는 쓰임새가 없고, 전용팬은 부피가 크다. 따라서 매일 삼시세끼 파니니를 눌러 먹는 게 아니라면 가뜩이나 공간이 부족한 부엌에 들이지 않는다. 그저 가지고 있는 팬으로 굽고 무거운 냄비, 통조림 등으로 누른다. 만약 이게 좀 답답하고 남들과 아주 다른 누름의 길을 걷고 싶다면 벽돌이라는 대안도 있다. 두 장쯤 구해 깨끗이 씻어 잘 말린 뒤 은박지로 두 겹 싸면 진짜 누르개보다 효율이 훨씬 좋으니 참고하자.
샐러드, 디저트로도 활용 가능한 빵
뜨거운 샌드위치까지 만들 수 있다면 하산해서 빵으로 본격적인 요리를 만들 단계이다. 식재료로서 쓰임새가 워낙 다양한 나머지 빵으로 짠맛 위주의 끼니 음식과 단맛 위주의 디저트 모두를 만들 수 있다. 일단 끼니를 해결해줄 음식은 판자넬라 샐러드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니 지방의 음식으로 빵(pane)과, 담아 먹는 우묵한 대접(zanella)이 만나 이름 지어졌으니 그야말로 빵으로 만드는 샐러드이다. 어차피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그게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 다시 한 번, 스폰지로서 빵이 채소의 즙이며 드레싱의 기름을 적절히 흡수해 전혀 다른 맛과 질감으로 샐러드에 공헌한다.
판자넬라 샐러드는 식빵류보다 지방을 적게 혹은 아예 쓰지 않는 바게트나 시골빵, 치아바타류가 더 잘 어울린다. 특히 토마토가 맛있어지는 여름에 제격인데 일단 토마토를 먹고 싶은 만큼 썰어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 버무려 둔다. 빵은 숭덩숭덩, 각 변의 길이가 3㎝안팎의 육면체로 썬다. 오븐이나 중불에 올려 달군 팬에 십 분 가량, 속까지 고르게 한 번 데워준다는 느낌으로 굽는다. 그 사이 즙과 수분이 듬뿍 배어 나온 토마토에 다진 마늘 약간과 썬 양파를 더해 버무린다. 빵이 다 구워지면 3분 가량 식혔다가 재운 토마토에 올리브기름을 끼얹어 한 번 버무리고, 마지막으로 빵을 더해 한 번 더 버무려 마무리한다. 온기가 아주 가시지 않은 빵이 맛있는 국물을 머금는 한편 겉은 살짝 부드럽고 속은 바삭해져 토마토와 잘 어울린다. 그대로 먹어도 든든하지만 아보카도나 닭가슴살을 얹으면 균형 잘 잡힌 한 끼 식사가 되고, 채소를 더 먹고 싶다면 오이를 함께 버무린다.
대미를 장식할 빵 디저트는 프렌치토스트이다. 잠깐, 그건 브런치 메뉴가 아닌가. 맞다. 브런치의 대명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만 계란물에도 설탕을 쓰고 단맛의 메이플시럽을 끼얹어 먹으니 디저트로 봐도 무방하다. 사실 맛있어서 많이 만들어 브런치로 먹은 뒤 남은 건 브런치의 디저트로 먹어도 좋을 지경이다. 판자넬라 샐러드도 그렇지만 프렌치토스트는 묵은 빵을 활용하는 요리로 알려져 있다. 당연하게도 고향인 프랑스에서 ‘못 먹는 빵(팽 페르뒤, Pain Perdu)’이라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묵어서 굳은 빵을 계란물에 적셔서 촉촉함도 살리고 맛도 한 겹 씌운다는 발상인데, 프렌치토스트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오해에 시달린다.
첫째, 진짜 묵은 빵으로 만들면 맛이 없다. 빵이 묵는다고 수분이 증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결정화되어 빵 속에 머물러 있다가 데우면 살아나므로 결국 예상보다도 프렌치토스트가 한층 더 축축해진다. 따라서 빵을 그냥 방치해 말리기보다 토스터에 노릇해지지는 않을 정도로 살짝 구워 만든다. 둘째, 같은 원리로 계란물에 빵을 오래 재워둘 필요도 없다. ‘밤새 계란물에 푹 재워 둔 빵’으로 프렌치토스트를 구웠다는 무용담을 주워 듣는데 빵이라는 스폰지가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부스러지거나, 설사 버티더라도 속은 익지 않아 축축함이 남아 있어 불쾌해진다. 게다가 프렌치토스트가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식인 브런치의 대표 메뉴라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오랜 시간 빵을 재워 두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널린 게 프렌치토스트 레시피이지만 오랜 세월 먹어서 요즘은 레시피 없이 만든다. 팬을 약한 불에 올리고 식빵 두 쪽을 토스터에 살짝 굽는다. 계란 두 개를 준비해 하나는 전체를, 하나는 노른자만 남겨 빵 전체를 담글 수 있는 납작한 그릇에 담아 너무 묽지 않을 정도로 우유를 더해 잘 섞는다. 소금과 설탕, 바닐라를 조금씩 더한 뒤 달궈진 팬에 버터를 녹인다. 버터가 지글지글 녹는 동안 빵을 계란물에 담그고 열까지 센 뒤 뒤집어 다시 열까지 세어 적신다. 팬에 올려 노릇해질 때까지, 한 면당 3분 가량 굽는다. 프렌치토스트에는 대개 메이플 시럽이나 꿀처럼 끈적한 감미료를 끼얹어 먹지만 백설탕을 한 자밤 솔솔 뿌리면 단맛과 함께 아삭함이 더해져 느낌이 색다르다.
<이용재 음식평론가>
스마터리빙
more [ 건강]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많이 본 기사
- 이민단속 ICE 요원들 복면 착용 금지되나
- 한인타운 오피스 40%가 비었다… ‘불황 심각’
- 한국 남성 암 1위는? 전립선암, 폐암 제쳐
- “중범죄·정부대상 사기 땐 시민권도 박탈” 추진
-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징역 23년형·법정 구속
- 방탄소년단, 광화문광장서 공연한다.. “서울시 조건부 허가”
- 차은우 측, 군복무 중 ‘200억 탈세’ 의혹 논란 “적극 소명할 예정”
- 지상렬, ♥16세 연하 신보람과 결혼 계획.. “문학구장서 하고파”
- 치매 예방 이렇게… ‘뇌의 노화를 늦추는 6가지 생활습관’
- 날뛰는 시설물 절도에 ‘암흑천지’… “치안불안 못살겠다”
- “父=주폭·형은 교통사고 사망” 가정사 고백 김영철, ‘유퀴즈’ 고정 요청에 재치.. “고정 댓글은?”
- 54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남가주 ‘해갈’
- “ ‘하반신 마비’ 강원래, 발톱 빠져도 통증 못 느껴”..♥김송이 전한 근황
- LA서도 이민단속 요원이 도주 용의자에 ‘총격’
- 뷰트너 LA 시장 후보 22세 여대생 딸 사망
- [타운 핫이슈]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LA 상륙… 고가에도 판매 ‘불티’
- “덴마크의 그린란드 주권 100년전에 인정”
- 병역의무자 국외 체류관리 ‘강화’
- 현대차그룹, 미국 시장 판매순위 4위 ‘우뚝’
- 올스타 팬 투표 1위 돈치치 트리플더블… 레이커스 2연승
- 김혜성, 다시 결전지로… “지난 시즌보다 나아질 것”
- 알카라스·사발렌카 호주오픈 3회전 진출
- 뉴스타부동산, 탑 에이전트 초청 감사 런천
- “국가대표는 내 자랑이고 영광”
- 부산여중고 신년하례식
- 그린란드 협상 국면… 트럼프 “관세 철회·무력 배제”
- 오픈뱅크, 외환 환전 서비스 제공
- [로터리] 가장 예민한 국경 파수꾼, 탐지견
- [한인단체 신년 인터뷰] L A 체육회 허연이 회장… “한인사회 더 건강하게”
- 전문가들은 지금 집을 살까, 팔고 있을까?
- 에어프레미아, 성장 지속 연 승객 첫 100만명 돌파
-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점진적 회복 기대”
-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새해에 드리는 기도
- 오픈AI, 18세미만 이용자 직접 차단
- 산불·이민 단속 피해 가구 주거비 지원신청 마감 임박
- 트럼프 취임 1년 맞아 미 전역서 반이민 항의 집회
- 불씨 여전한 이란 사태 파장 주시해야
- 트럼프, 월가 기관투자자 단독주택 투자 차단
- 트럼프, 올해 다보스 포럼 참석… ‘미 우선주의’ 천명
- 재미한국노인회·동방관광 23일 상생 협력 MOU 체결
- [윌셔에서] 남가주한국학원이 이룬 기적
- [지평선] 두쫀쿠 열풍
- 청라국제도시의 매력과 미래가치
- 트럼프 일가, 가상화폐 자산 급증
- “백악관 전화해 ICE 철수 요구하라”
- 알리소 비에호와 미션 비에호
- Dream For All vs 일반론… 자산을 바꾼다
- LA 한인상의 1월 정기 이사회 개최
- [경제 포커스] 트럼프서 시작된 가주 부유세 논란… 찬반 ‘격화’
- [왈가 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 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1/5지식톡

-
 중/고등학생 국제 “논리” 올림피아…
0
중/고등학생 국제 “논리” 올림피아…
0International Logic Olympiad (ILO) 2026 개최 안내국제 무대에서 당신의 사고력을 시험해 보세요! 전 세계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논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
 한국 안경을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0
한국 안경을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0안녕하세요.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보고싶다 안경원’입니다.저희는 다년간 한국 고객분들께 착용감 좋은 안경테와 한국안경브랜드,고압축 도수 렌즈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온 안경 전문점입니다.이번에 해외 배송이 가능해…
-
 미 육군 사관학교 West Poin…
0
미 육군 사관학교 West Poin…
0https://youtu.be/SxD8cEhNV6Q연락처:wpkapca@gmail.comJohn Choi: 714-716-6414West Point 합격증을 받으셨나요?미 육군사관학교 West Point 학부모 모…
-
 ☝️해외에서도 가능한 한국어 선생님…
0
☝️해외에서도 가능한 한국어 선생님…
0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상담신청문의♥️☝️ 문의 폭주로 '선착순 상담'만 진행합니다.☎️ : 02-6213-9094✨카카오톡ID : @GOODEDU77 (@골뱅이 꼭 붙여주셔야합니다…
-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테슬라 시트커버, 사놓고 아직 못 씌우셨죠?장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20년 경력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깔끔하고 딱 맞게 장착해드립니다!장착비용:앞좌석: $40뒷좌석: $60앞·뒷좌석 …
케이타운 1번가
오피니언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불씨 여전한 이란 사태 파장 주시해야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새해에 드리는 기도
 이명구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로터리] 가장 예민한 국경 파수꾼, 탐지견
 성민희 소설·수필가
성민희 소설·수필가 [윌셔에서] 남가주한국학원이 이룬 기적
 양홍주 / 한국일보 논설위원
양홍주 / 한국일보 논설위원[지평선] 두쫀쿠 열풍

[왈가 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 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정숙희 논설위원
정숙희 논설위원LA 필의 새 희망, 에사 페카 살로넨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미국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럽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미국 민주주의 ‘신뢰 기반’ 무너져
1/3지사별 뉴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 공식 취임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가 제57대 뉴저지 주지사로 공식 취임했다. 셰릴 주지사는 이날 뉴왁 소재 뉴저지 퍼포밍아츠센터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
추방재판 한인 4년만에 증가세

대사관 사칭 ‘보이스 피싱’ 다시 기승
주미한국대사관 사칭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애난데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사회는 메릴랜드의 중추”

이정후 선수와 함께하는 페스티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후 선수등과 함께 하는 팬 페스티벌 투어를 오는 24일(토) 산라몬에 있는 비숍랜치 시티센터에서 개최한다.이날 행사…
[알립니다] ‘온정의 슬리핑백’ 보내기 접수 마감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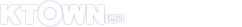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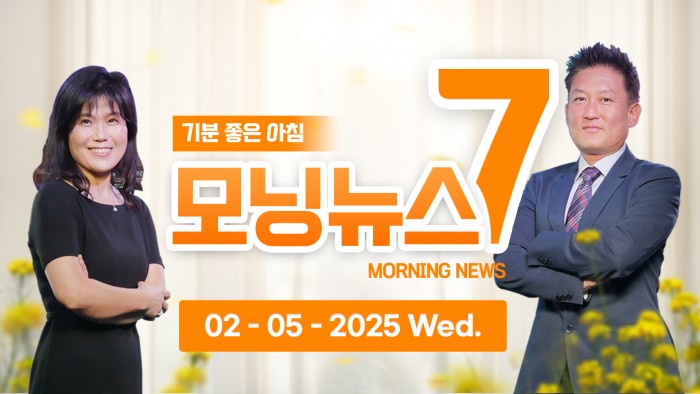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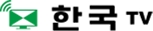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