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이오 전쟁 이후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와 어찌어찌해서 우리 동네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 농장 근처에서 한동안 굴을 파서 살다가 우리 엄마 눈에 띄어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한 엄마덕에 그애 아버지는 농장의 머슴으로, 경채는 식모애로, 동생 아이는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로 살게된 것이다.
경채는 나보다 두어살 위였는데 우리 식구들의 밥 당번에다 어느땐 머슴들의 새참까지 지어서 여름철이면 뙤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이나 논에까지 먹을거리들을 나르느라 그 짧은 목이 더 짧게 보이기도 했다. 지금도 그애를 생각하면 언제나 얼굴이 벌개서 농장 안을 바쁘게 휘젓고 다니던 일이 어제처럼 느껴진다.
그애 식구들이 얼마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살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대학생 때 그애가 시집을 갔으니까 적어도 몇년은 우리와 함께 산 것 같다. 그애가 시집을 가기 전에 먼저 홀아비로 살았던 그애 아버지를 어느 과부와 짝을 지어줘 나중엔 갓난 아기까지 태어 났으니까 우리 엄마는 그애 식구들에게 하느라고 하신 것 같다.
갑자기 그애를 부랴부랴 부천 어디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이유는 좀 유별났다. 그애가 어느 머슴과 눈이 맞았다는 것이다. 마침 그 머슴의 젊은 아내는 막 몸을 푼 후였다.
그 당시 경채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청승 맞게 잘 하지도 못하는 유행가를 기를 쓰며 부르기도 해서 그때 막 과부가 된 우리 큰 언니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어느 여름날 건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큰 언니가 살짝 그 방을 열어 보니까 경채와 그 머슴이 한덩어리가 되어 엉켜 있어서 기절을 한 언니가 엄마를 잠에서 깨웠고 집안은 곧 난리가 났다고 한다. 물론 나는 서울서 대학교를 다니던 때니까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들은 것이다.
"지가 들키지 않고 무사히 살 팔자면 잘 살꺼고 그렇지 않으면 소박댕이가 되서 오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엄마는 그애를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 우리 큰 언니는 일만 더 크게 만든다고 극구 말렸지만 엄마의 말씀대로 그애는 무사히 신혼을 보내고 나중에 아주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채의 아버지가 힘이 장사인 머슴이어서 우리 엄마는 그애가 시집을 갈때까지 그 일을 비밀에 부쳤었다. 무식한 그애 아버지기 알게 되면 그애는 뼈도 못추린다는 것이 엄마의 지론이었다. 쉬쉬 하면서 시집을 갔지만 우리 집에서 사는 머슴들이나 아낙네들에게 이미 소문이 퍼져서 결국 그때 막 몸을 푼 새댁까지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 머슴과 그 새댁도 별탈 없이 잘 넘어갔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머슴댁이 살결이 하얗고 얼굴색이 검은 편인 경채보다 훨씬 인물이 나아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나도 왠일인가 하고 어리둥절 해졌다.
그때 나는 ‘남녀사이는 겉으로 드러난 인물보다 뭔가 알수 없는 알쏭달쏭한 것이 있나보다’ 하고 어렴풋이 짐작을 했다. 수십년 뒤 내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오빠는 내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다. 경채 동생이 아주 부자가 되어 우리 오빠를 찾는다고 했다. 경욱이라는 그 남자애는 우리집에 있던 트럭의 조수로 따라 다니면서 운전을 배우게 됐고 나중에 운수업에 손을 대 부자가 된 것이라고 했다.
담담히 그말을 전하는 오빠 얼굴이 약간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다. 부잣집에 외아들로 태어나 생전 직업다운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그 많던 우리집 재산을 홀랑 다 들어먹고 마지막에는 선산까지 팔아먹은 오빠가 자기 집에서 부리던 아이가 부자가 되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들었을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살아 생전 아들만 생각하다가 저 세상으로 한많은 생을 살고 가신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애통했을까. 아마 그 경욱이라는 조그맣던 애는 우리 오빠를 만나면 한번 제대로 뽐내고 싶었을까. ‘나좀 봐라! 내가 한때는 너희 집에서 애기 머슴으로 살았지만 이제 나는 너보다 한수 위에 서있다’라고 하면서 말이다. ‘아버지는 머슴으로, 누나는 식모로, 나는 심부름꾼에서 트럭 조수로 따라다녔지만 이제 나를 아무도 깔보지 못한다’라고 기염을 토할까.
아무튼 세상은 돌고돈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래야 이 세상은 더 흥미롭고 공평할 것 같다. 지금 어디서 경채가 살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마 이제 그애는 옛날의 촌스럽던 때를 벗고 중후한 노인으로 변해 있을까. 어디서 서로 만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다만 옛날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그 정을 그애가 가끔 기억했으면 한다. 비록 목은 짧고 얼굴은 검었지만 웃을 땐 볼우물이 지던 그 경채라는 아이를 살아 생전 꼭 한번 보고싶다.
스마터리빙
more [ 건강]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많이 본 기사
- 카리브해 긴장고조…美 항모 투입 vs 베네수 대규모 軍 동원령
- 트럼프 ‘조지아 사태’ 거론하며 “해외 기술인력 데려와야”
- ‘대장동 항소포기’ 법무부 외압 있었나…엇갈린 주장 진실공방
- 김건희 보석 심문… “부부 동시구속 가혹” vs “증거인멸 우려”
-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 테슬라 10월 중국 판매량 뚝… “3년만에 최저”
- 트럼프 ‘셧다운 승리’ 선언했지만…건강보험료↑ 부메랑될수도
- 정성호 “항소포기 지시한 사실 없어…대통령실과 논의자체 안해”
- 美시민단체 “영상생성 AI ‘소라2’ 중단해야…딥페이크 위험”
- 트럼프, 40년 만에 캘리포니아 연안 시추 허용 추진
- “여보, 우리도 이민 갈까”…새로운 자금 피난처로 ‘이 나라’ 택한 中 부자들, 왜?
-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 1
- 마이클 잭슨 딸 “마약이 내 인생 망쳐…코에 구멍 뚫렸다”
- 英 ‘카리브해 마약 선박 정보’ 美에 중단…캐나다도 거리두기
- [건강포커스] “GLP-1 당뇨·비만약, 대장암 5년 사망 위험 60% 감소 효과”
- 한인 부부 변호사 동시 합격
- LA 렌트 컨트롤 ‘대수술’… 연 3% 인상으로 제한
- 국제 금·은 가격 다시 들썩…12월 미 금리인하 기대감
- 건진법사가 김건희 건넨 샤넬 가방·목걸이 첫공개…실물검증
- ‘사생활 논란’ 이이경 ‘놀뭐’’슈돌’ 하차..예능 삭제 ‘2연타’
- [인터뷰] “몸과 마음까지 치유… 자신감 되찾는 환자 볼 때 보람”
- 신규회원 선물권 제공 코스코 연말 프로모션
- 중국 천인계획, 한국 과학 인재 ‘약… 1
- “20대들 제발 결혼 좀 해”…하다하다 여기까지 온 中 정부, 파격 이벤트 보니
- 압수된 비트코인 9조…英서 자금세탁 중국인 징역 11년8개월
- 뉴섬 캘리포니아지사, ‘美불참’ 기후총회서 “트럼프는 일시적”
- “검사하면 이상 없다는데…” 팔 저리고 힘 빠짐 증상까지
- ‘항소포기 사퇴론’ 노만석 총장대행 연차 후 출근…묵묵부답
- 골드만 “美일자리, 지난달 5만개 정도 줄었을 것”
- 트럼프 ‘셧다운 종료’ 수순에 “우리가 민주당 상대로 크게 승리”
-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 “증거 인멸 염려”
- [셧다운 종결 여파와 전망] 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무산 경고등… ‘3중 충격’ 현실화
- 유타주 ‘연방 선거구 조정’ 소송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
- ‘위험천만 산악도로’… 버스 전복 26명 중경상
- “트럼프 이민정책… 미 경제성장 심각히 저해”
- 미국 홀린 K뷰티·패션… ‘케데헌’에 부스 장사진
- 잇단 10대 폭행에“쇼핑몰 가기 두렵다”
- 워싱턴 일원, 올겨울 눈 많이 오고 춥다
- 통증 완화 표방 ‘크라톰’ 비상… 과다복용 6명 사망
- 한인은행 자산·외형 성장세 지속… 호프·한미 ‘탑10’
- “쳇바퀴 속 ‘무한 슬로프’ 즐겨요”…세계 최초 ‘회전 실내 스키장’ 뭐길래
- 빅테크 유럽 투자 러시…구글, 독일 55억 유로·MS, 포르투갈 100억 달러
- 트럼프 “프랑스인들이 중국인보다 낫다고 생각해?”
- ‘2개월만 법정 컴백’ 민희진, 분노 입 열었다 “어도어 비상식적..법 악용”
- 폴킴 “아내와 통장관리 각자..내 돈은 허락받고 써야, ‘5만원 컨펌제’” [돌싱포맨]
- 백종원 예능 임박..더본코리아, 방송 철회 요구에 불쾌 “기업 죽이기 공격 못 참아”
- 셧다운 끝난다… 연방정부 기능 ‘정상화’ 눈앞
- 오늘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 롯데웰푸드,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서 ‘빼빼로데이’ 행사 펼쳐
- 산다라박, 씨엘 이어 또 한번 투애니원 언급..아쉬운 박봄 자리
1/5지식톡

-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테슬라 시트커버, 사놓고 아직 못 씌우셨죠?장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20년 경력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깔끔하고 딱 맞게 장착해드립니다!장착비용:앞좌석: $40뒷좌석: $60앞·뒷좌석 …
-
 식당용 부탄가스
0
식당용 부탄가스
0식당용 부탄가스 홀세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픽업 가능 안녕 하세요?강아지 & 고양이 모든 애완동물 / 반려동물 식품 & 모든 애완동물/반려동물 관련 제품들 전문적으로 홀세일/취급하는 회사 입니다 100% …
-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에듀스팟입니다…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케이타운 1번가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
민경훈 논설위원MAGA의 분열과 도널드 연합 세력의 붕괴
 황의경 사회부 기자
황의경 사회부 기자한인 단체의 영향력과 책임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상논단] 극우 담론의 부상, 세대 갈등과 낙인의 정치
 김영화 수필가
김영화 수필가 [화요칼럼] 마음에 심으려고
 조철환 / 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
조철환 / 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 [지평선] ‘환멸의 경제학’
 문동만
문동만 ‘수직의 배반자’
 옥세철 논설위원
옥세철 논설위원‘모든 것이 결국은 중국’이라고…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칼럼] 워싱턴의 멍청한 ‘헝거 게임’
 허두영 한국과학언론인회 회장
허두영 한국과학언론인회 회장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신화의 무게를 감당하라 : 잭 래컴 & 애덤 노이먼
1/3지사별 뉴스

한인사회 어려운 이웃에 따뜻함 전해지길
▶불우이웃돕기 쌀 나눔 행사, 30여 단체에 쌀1500여포 배부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임규흥)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11회 불우이웃돕기 …
연방대법, SNAP(푸드스탬프) 전액 지급 제동

“순조로운 정권이양, VA 전통”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끝났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공격도 서슴지 않던 치열한 공방 끝에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
워싱턴 일원, 올겨울 눈 많이 오고 춥다

상원서 ‘셧다운 종료’ 예산안 통과…이르면 12일 하원서 표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 상원 문턱을 넘었다.이날로 41일째 이어진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
봉사회 기금 모금 골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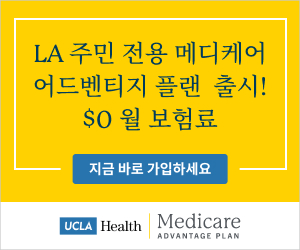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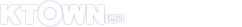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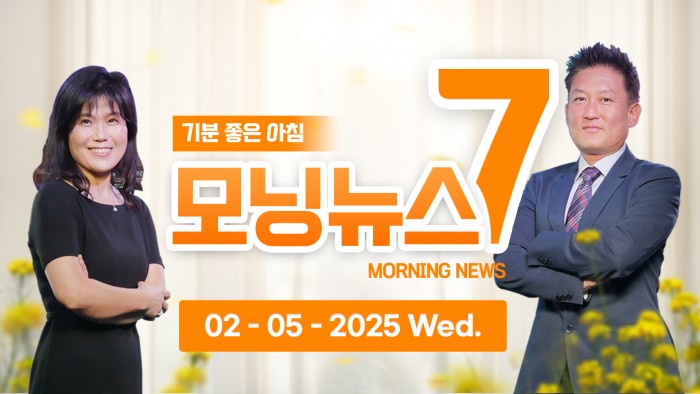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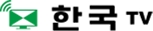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