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미 수필가 /포토맥, MD
추억은 늘 삐죽, 예고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무명치마에 한기를 묻힌 채 마실오시던 할머니의 오랜 친구처럼 기척없이 그렇게 찾아오곤 한다. 폭설에 감금당한 밤, 살아온 날들의 겨울추억이 또 그렇게 삐죽, 내 마음을 열고 들어왔다.
어릴적 오목하던 초가에 눈이 내리면 창호문 너머의 밤은 달밤처럼 환했다. 그런 밤이면 마당을 덮은 눈이 토방으로 올라오는 소리, 식구들의 신발 속으로 숨어 들어오는 소리가 베개 밑으로 들려왔다. 대숲에 걸려 있던 눈덩이가 한꺼번에 투두둑 떨어지는 소리,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소나무 가지가 가까운 산에서 타악,하고 꺾이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 새벽 동이 트기 전의 제일 추운 시간, 식어진 아랫목에서 내 남은 잠은 옹송거리고 군불 때는 아궁이 속으로 깊숙이 던져지던 마른 솔가지에서도 타악타악, 같은 소리가 났다. 오롯하게 올라오던 온돌의 온기에 몸 담그고 다시 아득한 잠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아련하게 듣던 넉가래와 싸리비가 눈을 쓸어내던 소리… 겨울은 추었지만 추웠던 겨울은 따뜻한 소리의 기억만을 남기고 있다.
도화지 오려 스무색깔 왕자파스로 예배당의 뾰족탑을 그리고 그 뾰족탑 위에 노랑색 별 하나 그려넣어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들던 유년의 겨울은 카드 속의 풍경처럼 단조로웠다. 그 나무십자가 걸려 있던 예배당에 성탄절이 찾아오면 아이들은 줄서서 달콤한 팥이 켜켜이 묻어 있는 시루떡을 받아왔다. 그 시절 예수님은 시루떡이었다. 노란 별을 타고 겨울에 한번씩 찾아오는 따뜻한 시루떡이었다.
여름밤에 플라타나스 무성한 그림자를 밟고 앞서 가던 남학생, 그 빼곡하던 플라타너스 잎사귀의 자리에 흰눈이 내려앉던 겨울이 되도록 마주쳐 보지 못한 그 뒷모습이 나의 첫사랑이었음을 감지한 것도 겨울이었다. 나만을 생각하던 한평짜리 마음자리에 타인을 들여 놓고 비좁아 잠들지 못하던 처음사람, 첫사랑은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일깨워주고 내 마음자리에서 떠나갔다. 첫눈처럼 왔다 간 첫사랑은 어설퍼서 아름다웠다. 언제나 짧은 건 슬프고 또 슬픈 건 아름다운 법이 아닌가.
도회지에서 만난 겨울은 황량했다. 저문 겨울날 하늘까지 올라가 있던 아파트의 창문들이 퍼즐처럼 탁,탁,탁, 불을 밝히는 그 도시의 끝을 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외로웠다. 쿨럭쿨럭 바람에 통째로 흔들리는 포장마차를 지나 아스피린을 팔던 작은 약국 모퉁이를 돌아 연탄재가 함부로 쌓여 있는 그 좁은 골목의 제일 끝에 붙어 있는 자취집은 언제나 아랫목에 애매한 온기를 내밀며 나의 기척을 기다리곤 했다. 화라락 번개탄에 붙은 성냥불이 아랫목의 확실한 온기가 될 때까지 서성이고 서있으면 성북행 전철이 달그락거리며 귓전을 밟고 지나갔다.
밤 늦어 돌아온 남동생을 위해 라면을 끓이는 밤, 연탄 위 불먹은 삼발이는 달궈진 별이 되어 싸르르륵 양은냄비를 끓이고 얇은 벽 너머 가난한 부부의 싸움은 그날 밤도 계속되었다. 모든 게 불확실하던 시대, 두봉지 라면에 찬밥까지 말아먹어야 채워지던 동생의 허기처럼 우리의 젊음은 허기로 가득했다. 알전구 밑에서 수백개 인체의 뼈이름을 주술처럼 외우던 동생, 그 주술의 힘으로 동생의 미래만은 확실해지길 바라며 돌아눕던 그날 밤도 밤바람소리가 우리들의 두평짜리 좁은 쪽창을 흔들어댔다.
첫아이의 달콤한 하품과 팔 올린 나비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천번은 넘어지며 떼어 놓던 그 아이의 첫걸음을 지켜보던 겨울의 기억이 가슴 속에 아직 말랑하다. 오리길을 걸어온 광주리 속의 떡가래처럼 아직 말랑하고 보드랍다. 아이에게 눈, 누-운, 눈사람, 눈,사,람, 이라고 가르쳐주면 오디같이 까만 아이의 눈은 내 입을 바라보고 나는 아이의 작은 입이 오물거리는 것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행복은 품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라 깨달으며 뒤뚱거리는 아이의 걸음을 쫓아다니던 그해 겨울,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겨울나기를 했다.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노래가 된 목월시인의 이별의 노래가 떠오르는 밤이다. 빈 하늘로 새들이 날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생각나는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마음도 눈도 그렁그렁하게 한다. 미혹을 전제로 한 낱말일지도 모르는 불혹이라는 나이에 목월시인이 일으켰던 일탈의 사랑이 그 시의 모티브였다는 불편한 진실….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윤리를 비켜섰던 그의 사랑은 끝이 났고 노시인도 우리의 곁을 떠난지 오래이다. 다만 그의 시만이 그렁그렁한 노래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창밖은 계속 눈이 내리고 전나무에 켜둔 작은 크리스마스등들이 홈빡, 눈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참 예쁘다. 넘어짐은 일어섬을 전제로 하고 일어섬은 넘어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지난 한해가 감사하다.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경기 역시 딛고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 둘 셋 넷, 저 전나무의 작은 등불처럼 내 마음에도 감사의 등들을 걸어보면 어떨까. 날 저물어 나란히 돌아와 있는 식구들의 신발들 그 이유에 하나, 먼나라의 폭설소식에 전화를 걸어온 노부모의 목소리, 아직은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에 또 하나, 내일 하오가 되면 폭설이 우리의 감금을 풀어줄 것이라는 소식에 또 하나…….행복은 언제나 하찮은 것들이 가져다 주었다.
스마터리빙
more [ 건강]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
모교에 200만불 기부
로스알토스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 사업가 노의용(제임스 노)씨와 부인 이선은씨가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에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노의용씨와…

한국음악무용예술단, 에콰도르 로하 축제서 공연
김동석 교수가 이끄는 한국음악무용예술단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에콰도르 로하에서 열린 제10회 로하 국제예술축제에 첫 한국 대표로 참가해…
성남고 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
남가주 성남고 동문회의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22일 LA 옥스포드 팔레스호텔 1층 갤러리아 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이…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이사회
서울사대부고 남가주 동창회(회장 김흥숙)가 지난 22일 세리토스에 위치한 서울대 동문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신·구 임원진…
외대 동문회 장학생 모집 동문 자녀 대상 지원접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장학위원회가 동문 자녀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동문회 측은 젊은 세대 동문들과의 유대관계 형…
많이 본 기사
-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조치 2년 연장”
- “선생님과 인연 없는 배우 있겠나”…이틀째 故이순재 조문 행렬
- “올해 최악 독감시즌 될 것” 경고
- 세계 최대 생나무 크리스마스트리… LA 시타델서 불 밝혀
- 복수국적 2세 피해 방지… ‘국적유보 신고제’ 추진
- 베조스 부부 뉴욕 메트갈라 스폰서 선정 논란
- 李대통령, ‘법관모욕 변호사’ 수사·’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 등돌린 김건희비서 “’건진 심부름으로 해달라’ 金요구에 허위진술”
- 한인 연방판사 “유력 대법관 후보”
- 한덕수 “尹 계엄 결정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1월 21일 선고
- 연말 샤핑시즌 ‘현관 해적’ 경계령
- 野 “죄 지우기 바쁜 대통령” 與 “명예훼손·모욕”…법사위 공방
- 홍명보호 아이러니, 죽음의 조 확률 오히려 올랐다... 이탈리아·덴마크 PO 패스 결국 ‘포트4’ 배정
-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탑재위성 13기 궤도 안착
- 가주 재정적자 악화… 내년 180억불 달할듯
- 뉴저지한인회장 선거 내분 ‘점입가경’
- 미국 매체 “한국·노르웨이·폴란드와 만나면 ‘월드컵 최고 스타조’”
- “테슬라 급발진 화재에 문 안 열려 희생됐다”
- 맘다니 인수위에 한인위원 최소 3명
- ‘불륜설’ 아리아나 그란데, 은퇴 선언 ‘충격’.. “마지막 무대”
- 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당국 “36명 사망·279명 실종”
- 박소현, 건망증 악화된 근황 “똑같은 소개팅男 두 번 만나”
-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조치 2년 연장”
- 연휴 LA공항 이용객 250만명 사상 최다
- 킹달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미주한인 방문 급증
- 모교에 200만불 기부
- 민주 하원의원, 韓日 등 인도태평양 동맹 관세 폐지법안 발의
- 1년 6개월만..’이혼 맞소송’ 박지윤·최동석, 드디어 결론 나온다
- “007(24시간·7일) 근무 중 시장 다 내줄 판” 업계 호소에도 예외 불발
- ‘그때 그사람’ 가수 심수봉, ‘10·26’ 김재규 재심 증인 불출석
- “美특사, 러 보좌관에 ‘트럼프 칭찬’ 조언” 통화 유출 파장
-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 클라라, 이혼 후 또 의미심장 글
- 묵직한 카레는 가라… 점심마다 줄 서는 ‘향신료 카레’
- 양세찬, 아이돌 질문에 급정색 “얘기하기도 싫어” (나래식)
- 法 “장우혁 폭행 가능성 더 높아”..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1심 무죄
- 바이든 고령 조롱했던 79세 트럼프도 ‘나이는 못 속여’
- 24년 만에 재탄생..프로미스나인, ‘하얀 그리움’ 첫 콘셉트 포토 오픈
- 오바마케어 보조금 2년 더 연장되나
- [송년행사 게시판] 대한항공 여승무원동우회 外
-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 1
- ‘조금만 도와주는 일’의 아름다움
- 대한항공, 친환경 기내식 용기 도입
-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이사회
- HD현대 컨선 69척 수주… 2007년 이래 연간 최대 규모
- 메타 “구글 AI 반도체 도입 검토”… ‘엔비디아 천하’ 흔들
- 외대 동문회 장학생 모집 동문 자녀 대상 지원접수
- 특허 1.3만개 보유한 ‘R&D 메카’… “한국 제조업 탄탄” 파트너 낙점
- 미국, 실패한 우크라이나 정책으로 회귀
- [미국은 지금] 2025년 추수감사절의 그림자
- 추수감사절 식탁비용 ‘비상’… 최고수준 올라
1/5지식톡

-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테슬라 시트커버, 사놓고 아직 못 씌우셨죠?장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20년 경력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깔끔하고 딱 맞게 장착해드립니다!장착비용:앞좌석: $40뒷좌석: $60앞·뒷좌석 …
-
 식당용 부탄가스
0
식당용 부탄가스
0식당용 부탄가스 홀세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픽업 가능 안녕 하세요?강아지 & 고양이 모든 애완동물 / 반려동물 식품 & 모든 애완동물/반려동물 관련 제품들 전문적으로 홀세일/취급하는 회사 입니다 100% …
-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에듀스팟입니다…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케이타운 1번가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정숙희 논설위원‘조금만 도와주는 일’의 아름다움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미국, 실패한 우크라이나 정책으로 회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2025년 추수감사절의 그림자
 이현숙 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
이현숙 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 [수요 에세이] 미시시피 강의 물결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김 부장 이야기’와 취업난 실상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연말 샤핑은 한인타운·한인업소에서
 민경훈 논설위원
민경훈 논설위원새나가는 권력과 도널드의 분노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스마트도시·건축학회장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스마트도시·건축학회장 [로터리] 하이퍼로컬, 동네 2.0
 정유환 수필가
정유환 수필가 [화요칼럼] 넌 할 수 있어, 말해주세요
1/3지사별 뉴스

정혜선한국전통예술원 ‘아리랑-동방의 울림’공연 성황
정혜선한국전통예술원의 특별공연 ‘아리랑-동방의 울림’(Arirang-Echoes of the East)이 지난 23일 전석 매진속에 뉴저지 포…
오바마케어 보조금 2년 더 연장되나

한인 2세‘발목’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빛 보인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K-음식과 문화 함께 버무렸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조치 2년 연장”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 보…
[알립니다]‘온정의 슬리핑백’ 보내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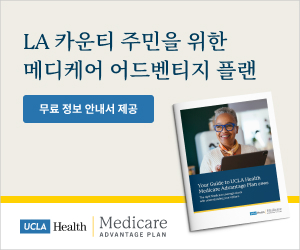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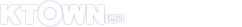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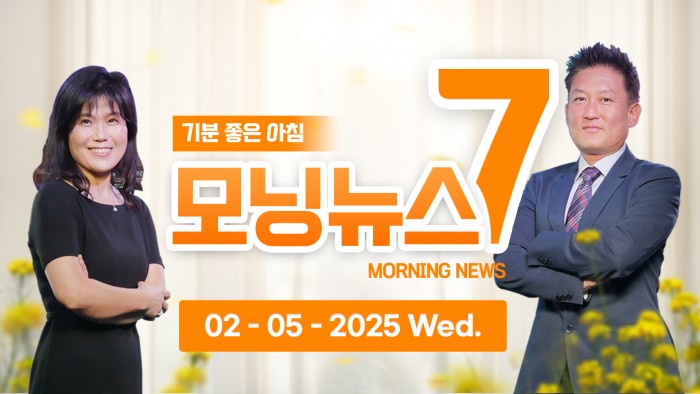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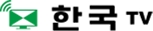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