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인이 용하게 자기가 나가는 시간에 도착한 버스에 막 올라타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황 노인 이었다. 아침마다 7, 8명이 맥도날드에 모여 커피를 마시는데 한사람 이라도 빠지면 모두 걱정한다. 그래서 김노인은 이미 발판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차속에서 한국말로 큰소리칠 수 없어 병원쪽을 가리키며 지금 문병간다고 알려주었다. 맥도날드에 모이는 사람은 모두 다 노인회 회원들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에 노인회에 가서 밥먹는 것 말고 별도로 아침마다 매일 만나고 있다. 대장이 따로 없다. 그저 아침에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미국 사정 돌아가는 얘기며 평소 밉상구는 꼴통놈 한두번 씹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돌아간다.
김노인이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원 말이 어머니가 밥을 전연 먹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것이다. 이제 정신이 조금 드시나 보다. 어머니는 정신이 들면 밥을 아예 먹지 않겠다고 떼를 쓴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온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정신이 오락가락 하기만을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김 노인은 시계를 세월이라면서 눈에 보이는 시계는 손목시계며 벽시계 할 것 없이 모조리 때려 부시는 어머니를 이제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오래전 아들을 못낳는 어느집 후처로 들어간 어머니는 연달아 세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김 노인의 두 동생은 장성한 후에 차례로 자살하고 말았다. 어머니는 둘째도 잃고 막내 동생을 잃었을 때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을 한참 내려다 보시다가 괘씸한 놈! 하고 죽은 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어머니는 그때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김 노인을 따라 20년전에 미국에 온 어머니는 얼마나 알뜰하게 생활하시는지 노인 아파트에서 공짜 물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고 돈내지 않는다고 병원에 함부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편안하게 미국사는 것도 고마운데 날짜 한번 어기지 않고 나라에서 돈을 주니 이런 효자가 어디있어? 그렇게 말할때는 어머니가 온전한 상태였다. 한국에서 엿장수가 와서 돈되는 쓰레기 다 가져가면 금방 부자가 되겠다고 웃으시던 어머니는 그 후 김노인의 마누라가 몇 년전에 죽고부터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못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음정도 틀리지만 어머니가 가끔 혼자서 읍조리는 그 노래처럼 요즈음은 김노인의 마음도 그 노래와 똑같았다. 그렇지만 하나 있는 딸년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면서 갓난아기 입에 똥을 밥이라고 먹여 죽게한뒤 같이 못살겠다고 뉴욕으로 직장을 옮겼고 별다른 기반도 없이 돌아가고 싶어도 자기는 한국에 갈 수 없었다.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이 그립고 길가다가 아무데나 사먹을 수 있는 한잔 소주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것도 사실이었다. 비좁은 버스속에서 어깨만 살짝 부딪혀도 실례가 되는 미국에서 김 노인은 살면 살수록 자꾸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맥도날드에 모이는 노인들도 한 두명이 자꾸 줄어 든다. 며칠 나오질 않아 알아보면 어김없이 병원에 입원했다. 요즈음은 꿈에 죽은 동생놈과 마누라 얼굴이 자주 나타난다. 사람이 늙으면서 죽은 형제나 죽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려는 징조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김 노인은 다음에 두 동생을 만나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드냐고 꼭 한번 묻고 싶다. 어머니보다 먼저 목숨을 끊은 두 동생이야 말로 정말 괘씸한 놈이다. 김 노인은 어머니를 다독거려 주고 두 시간쯤 있다가 나왔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이 발길. 그러나 노래처럼 정처없다기 보다 힘없는 발길이다. 잠시 여행도 아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봤자 옛날에 알던 친구들은 다 자기살기 바쁘고 세월 좋을 때 빠져나갔다가 별볼일 없이 돌아온 놈을 예전처럼 반기지도 않을 것이다.
버스에서 내린 김 노인은 모이는 사람들이 다 갔겠지 그러나 혹시나, 하고 눈앞에 보이는 맥도날드 안으로 들어갔다. “어이, 선배. 잘왔네.” 아직 가지 않고 남아있던 서너명의 멤버들이 반갑게 소리쳤다. 아, 하루도 안보면 궁금하고 그리운 저 얼굴들. 김 노인은 옛날부터 자기 이름 때문에 수모를 많이 겪었다. 형들이 선배! 하고 불러놓고 어린놈 보고 선배라고 부르니까 멋적은지 뒤에 꼭 욕을 갖다 부치며 엉덩이를 걷어 채였지만 미국에 살다보니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었다. “선배, 아직 안죽었네? 오늘은 자네가 없으니까 얼마나 심심했는 줄 알어? 커피 시켜줄께 두잔 마셔.”
그래, 고향이 별거드냐. 어딜가면 이만한 데가 있으랴. 사는곳에 사람 냄새나고 친구가 있고 정들면 고향이다. 그래서 소똥같이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하지 않는가. 가족 걱정에 사는 걱정없으면 죽은 다음에 망자들이 갖는 재미없는 세상이다. 김 노인은 조금 전까지 한국가고 싶은 정처없던 생각이 언제 그랬드냐는 듯이 말끔히 사라지고 나라에서 꼬박꼬박 돈 받으며 한가롭게 사는 이곳이 새삼스레 좋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웃음이 자꾸 나왔다. 그래, 역시 늙으면 미국만한 곳도 없다.
스마터리빙
more [ 건강]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
[‘파친코’ 이민진 작가,인터뷰] “이민자와 취약계층 보호해야”
재미 한인 작가 이민진(57)씨가 새해 1월1일 뉴욕시장으로 취임하는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에 대해 “맘다니 시장이 긍정적인 변화…

김응화무용단, LA 카운티 연말축제서 ‘화관무’
김응화무용단이 지난 24일 열린 LA 카운티 연말 문화행사 제66회‘할러데이 축제’ 무대에 초청돼 한국 전통무용 ‘화관무’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민단속·산불 영향 LA카운티 인구 감소
LA 카운티 인구가 올해 상당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 재무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준 LA카운티의 인…
한인 2세, 드라마 ‘런’ 주연 맡아
권호열 세계무술총연맹 총재의 아들 에릭 권씨가 주연하는 드라마 ‘런(RUN)’ 시사회가 지난주 버지니아 애쉬번 소재 리걸 폭스 극장에서 열렸다…
[송년 행사] 코윈 퍼시픽 LA
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퍼시픽 LA(회장 조미순)는 23일 LA 용수산에서 2025년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가정폭력 피해 …
많이 본 기사
- “유부남과 엘리베이터서 진한 키스” 트로트 女가수 상간 ‘충격’
- ‘3특검 끝’ 법정다툼 본격화…尹부부 11개 재판 결론은
- “트럼프-머스크 화해 중재자는 차기 대권 유력주자 밴스”
-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 “中, 대만 포위 좁히고 바로 실탄훈련…美 등 외부개입 억제신호”
- 러 “합의 근접했다는 트럼프에 동의…우크라, 돈바스 철군해야”
- ‘87세’ 김영옥, 하반신 마비된 손자 간병.. “누구든 아픔 있어” 고백
- 진양혜母 치매, 손범수父 입원.. “병원서 자는날 늘어남” 먹먹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개콘’서 성형 중독 고백.. “외모 만족 안 돼 “
- 한예슬, ♥남편과 스키장서 보낸 연말..신혼 같은 로맨틱 부부
-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시설 타격 시사…첫 육상 공격 가능성
- 영주권자도 생체정보 전면 확인 1
- 백악관 “트럼프, 푸틴과 우크라 관련 긍정적 통화”
- ‘진통제 투혼’ 김민재 잊었나, ‘배은망덕’ 불타는 독일 현지 여론 “가장 실망한 선수 5위”
- ‘은퇴 번복→폭탄선언’ 호날두 “1000골까지 계속 뛸 것”
- ICE 단속 전략 전환… ‘현장 체포’ 급증
-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 과속·음주운전 처벌 가주서 대폭 강화
- 트럼프, 휴일 취재진에 식사 권하며 “뇌물로 여길건가”
- 공화·민주,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일제히 ‘이대남’ 구애
- 젤렌스키 “美, 15년간 안전보장 제안…최대 50년 원해”
- 신년 연휴에 또 비 이번주 ‘강풍주의보’
- 워싱턴 일원‘슈퍼 독감’비상
- 中 “美, 대만에 무기 팔면 스스로를 해칠 것…70년전 중국 아냐”
-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위헌 아니다“
- 자개로 새긴 소나무, 자연과 시간을 동시에 품다
-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시설 타격 시사…첫 육상 공격 가능성
- 뉴욕주 독감 감염자 역대 최고
- 샤핑시 환불 정책 꼼꼼히 살펴야
- 하워드 카운티·의회 미주 한인의 날 공동 선포
- Meals Tax 미리 걷은 한인식당, 환불 약속
- 이민자 트럭 운전사들 “면허박탈 위법… 2
- 맨하탄 교통혼잡세 판결 내년으로 넘어가
- 401(k) 백만장자 50만명 돌파… 시간·복리 투자 ‘결실’
- 하워드 카운티‘올해의 골프선수’에 한인 학생
- 워싱턴 일자리 4만개 없어졌다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사법,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 트럼프 정부, 이민 2세대까지 공격
- 다크 초콜릿·커피 속 ‘테오브로민’… “세포 노화 늦춘다”
- MD 락빌서 대형 트레일러,아파트 건물 충돌 직전 멈춰
- “라티노 이웃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 NFL까지 접수한‘케이팝 데몬 헌터스’
- 2025년의 최대 패배자(Loser … 2
- LA시 아파트(1978년 이전 건설) 렌트비 연 4% 이상 못 올린다
- [메건 매카들 칼럼] 역차별 당하는 젊은 백인 남성들
- 연말에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경북서 손자·조부까지 3대 ‘비극’
- 5 Fwy 다중추돌 참사 1명 사망·15명 부상
- 고금리·고가격·관세 ‘브레이크’… 신차 시장 썰렁
-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어요”
- “지금은 하늘에... 아빠가 뛰던 곳이란다” 故 조타 아들 둘, 반 다이크 ‘손 꼭 붙잡고’ 안필드 찾았다
- 브리짓 바르도 별세 왕년의 스타, 91세로
1/5지식톡

-
 미 육군 사관학교 West Poin…
0
미 육군 사관학교 West Poin…
0https://youtu.be/SxD8cEhNV6Q연락처:wpkapca@gmail.comJohn Choi: 714-716-6414West Point 합격증을 받으셨나요?미 육군사관학교 West Point 학부모 모…
-
 ☝️해외에서도 가능한 한국어 선생님…
0
☝️해외에서도 가능한 한국어 선생님…
0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상담신청문의♥️☝️ 문의 폭주로 '선착순 상담'만 진행합니다.☎️ : 02-6213-9094✨카카오톡ID : @GOODEDU77 (@골뱅이 꼭 붙여주셔야합니다…
-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테슬라 시트커버, 사놓고 아직 못 씌우셨죠?장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20년 경력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깔끔하고 딱 맞게 장착해드립니다!장착비용:앞좌석: $40뒷좌석: $60앞·뒷좌석 …
-
 식당용 부탄가스
0
식당용 부탄가스
0식당용 부탄가스 홀세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픽업 가능 안녕 하세요?강아지 & 고양이 모든 애완동물 / 반려동물 식품 & 모든 애완동물/반려동물 관련 제품들 전문적으로 홀세일/취급하는 회사 입니다 100% …
-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에듀스팟입니다…
케이타운 1번가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
옥세철 논설위원2025년의 최대 패배자(Loser of The Year 2025)는?

세밑의 단상(斷想)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역차별 당하는 젊은 백인 남성들
 조형숙 시인·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조형숙 시인·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겨울 모서리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봉황의 청와대 귀환

새해 더 중요해지는 노동법 준수

연말연시, 안전하고 차분하게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칼럼] 지미 라이의 마지막 희망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미국의 힘
1/3지사별 뉴스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위헌 아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 시행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시도를 기각시…
맨하탄 교통혼잡세 판결 내년으로 넘어가

워싱턴 일자리 4만개 없어졌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정부효율부(DOGE)의 대대적인 연방공무원 감원 칼바람에 올 한해동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 등…
워싱턴 일원‘슈퍼 독감’비상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시설 타격 시사…첫 육상 공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지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단행됐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최저임금 또 오르고… 유급 병가는 더 확대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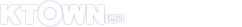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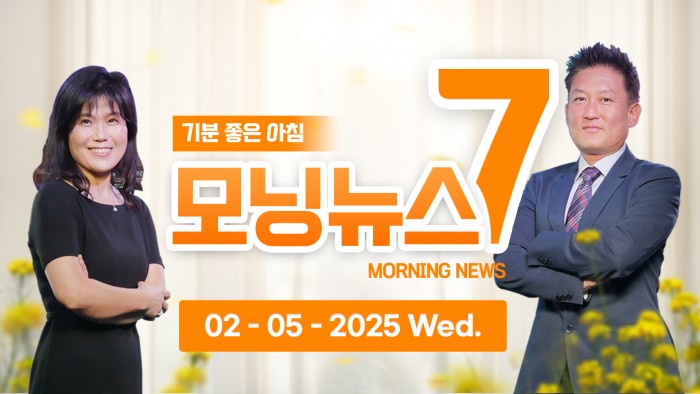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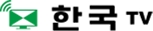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